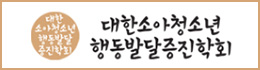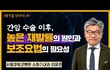2000년대 후반부터 급성심정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연관 교육 단체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증가하였다. 하지만, 소아 심폐소생술 관련 일반인 교육은 일부 교육계층을 제외하고는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조차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닌 가운데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 영아급사나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
먼저 응급실에 방문하는 소아 심정지는 성인 심정지와 비교했을때 평균 발생 빈도가 드물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부분이나 사전 교육에 대해서 재대로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실제로 접하게 된 의사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간 소아 심정지 발생과 응급실 방문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병원별로는 연간 7.8회명의 소아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가장 많은 병원인 경우 5년간 130회의 소생술이 시행되는 등 흔하지 않다고 간과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교육과정에 영유아 및 소아 심정지 소생술 교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 관련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성인과 소아로 나누어진 전문심폐소생술 의료인 교육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회 위원 이미진 교수는 “소아 심정지 발생이 적은 병원일수록 훈련과 교육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인의 경우 소아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교육에 대한 참여율도 성인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에 비해 18배가량 저조하다. 의료인들이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를 병협이나 유관학회 차원에서 교육강화에 힘써야한다.”며 제언했다.
따라서 생존율에서도 역시 성인과 비교해볼 때 특징적으로 발생 연도별 경향분석에서 소아 심정지 발생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동일 기간에 응급실에서 시행된 성인 심폐소생술 성적은 심인성 심정지 생존율 향상에 따라 전체적인 생존퇴원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2008년 11.8%, 2010년 11.7%, 2012년 13.6%, P for trend=0.001), 소아 심정지인 경우 성인보다 생존 예후가 좋음에도 높은 생존 예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2008년 13.6%, 2010년 11.3%, 2012년 13.7%, P for trend=0.870).
그렇기 때문에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이사 노태호 교수는“소아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반인 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인 교육도 중요하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종사자인 경우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 중에 선천적 심장질환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어렸을때부터 주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학생에게 충치검사만 지원할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장검사를 지원해야한다”면서 조기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